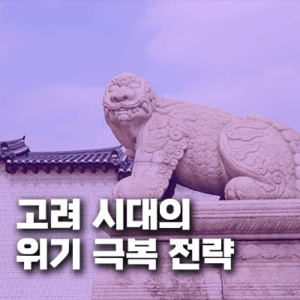
1. 전대미문의 위협, 몽골 침략에 직면한 고려
13세기 동아시아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들의 예봉은 이제 한반도의 고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여 년간 무려 7차례에 걸친 대규모 침략과 그 이후의 간섭기까지, 고려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외세의 침략 앞에서 많은 국가들이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고려는 놀랍게도 자주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며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고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 전체의 저항 의지, 그리고 문화적 역량까지 총동원된 복합적인 ‘위기 극복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몽골 침략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려가 보여준 문제 해결 전략과 끈질긴 저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와 통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 전략적 선택과 대가를 치른 강화도 천도

몽골은 1차 침략(1231년)에서 파죽지세로 고려를 압박하며 수도 개경(開京) 코앞까지 진격해왔습니다. 육상에서 몽골 기병대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판단 아래, 고려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崔瑀)는 전격적으로 ‘천도’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1232년, 수도를 방어가 용이한 강화도(江華島)로 옮기는 ‘강화도 천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몽골의 강력한 육상 공격을 피해 해상 방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육지와 인접해 있지만 좁은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고려는 해상 방어에 능숙했기에 몽골군이 쉽게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일견 ‘도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왕과 중앙 정부를 보존하고 국방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항전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고려는 중앙 정부가 와해되지 않고 몽골에 대항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했으며, 약 30여 년간에 걸친 대몽 항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천도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살육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강화도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은 전례 없는 대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민중의 끈질긴 저항과 자주 의지의 상징, 삼별초

고려의 대몽 항전은 비단 중앙 정부만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토에서 몽골군에 맞서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끈질긴 저항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삼별초(三別抄)’가 있었습니다. 삼별초는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으나, 대몽 항전 과정에서 몽골군에 대한 뛰어난 전투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항전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 조정이 몽골에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도(還都)하려 하자, 이를 민족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몽골과의 강화를 결사반대하며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1270년, 배중손(裵仲孫)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는 강화도를 떠나 진도(珍島)로 근거지를 옮겨 용장성(龍藏城)을 쌓고 고려의 자주적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다시 제주도(濟州島)로 옮겨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몽골-고려 연합군에 의해 진도와 제주도가 함락될 때까지, 삼별초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웠던 민중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항쟁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지배층의 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고려의 대몽 항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기억됩니다.
4. 다층적 접근: 외교와 무력의 병행, 그리고 정신적 저항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 동안 일방적인 무력 저항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무력 항전을 벌이는 동시에,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는 다층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몽골에 보내면서 항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몽골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대신 간접 지배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고려인들은 정신적인 통합과 문화 수호에도 힘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조판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고려 현종 때 제작된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자, 고려는 다시 한번 온 국가의 역량을 모아 『재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6년에 걸쳐 8만여 장에 달하는 방대한 경판을 조각한 이 작업은 단순한 종교적 사업을 넘어, 국난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기술력을 집약한 ‘정신적 항전’의 결정체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예술적,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도 합천 해인사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군사적 방어와 외교적 협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나아가 문화적·정신적 역량까지 총동원하며 전례 없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5. 역사에서 배우는 위기 극복의 지혜
고려의 몽골 침략기 역사는 한 국가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유연하고도 끈질기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강화도 천도를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삼별초와 백성들의 자발적인 민중 저항,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와 항전을 병행하는 다층적 외교-군사 전략, 나아가 팔만대장경 조판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정신적 통합까지, 고려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가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랐고, 고려는 결국 원 간섭기라는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가 보여준 끈질긴 저항은 완전한 정복 대신 간접 지배를 이끌어냈고, 이는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고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더 읽어보기
고려,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서 피어난 과학 문명: 금속활자에서 농업 기술까지

